관련링크
본문
옛 선비들의 탐방... <길 위의 인문학>은 ‘순례(巡禮)’다
- 남명을 만나는 길에서 -
1.
“산을 보고, 물을 보고, 그리고 역사 속의 고인을 보고 그들이 살았던 세상을 보라(看山看水 看人看世)”
이는 조선시대 남명 조식(南冥 曺植)의 말이다. 퇴계 이황(退溪 李滉)과 함께 큰 스승으로 존경받았던 그가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했던 말이다. 그 의미를 살린 위 번역은 경상대 최석기 교수의 것이다. 남명은 지리산을 10번 이상 유람했는데, 그는 지리산이라는 자연의 풍경만을 즐긴 것이 아니었다. 지리산을 통해 이전에 다녀갔던 선현(先賢)를 만났고 그들이 살던 세상을 만났던 것이다.
옛 선비들에게 자연은 인간과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공자(孔子)도 산수를 보면서 인간의 덕성인 인(仁)과 지(智)를 말하기도 했고(仁者樂山 知者樂水), 태산에 올라보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登泰山而小天下)며 사람이 견문이 넓어지면 그 보는 것도 달라진다고도 말했다. 그들은 자연을 통해 세상을 읽었고 사람을 읽었기에 자연은 ‘문자화 되지 않은 책’이었으며, 탐방-옛말로 유람(遊覽)-은 걸어 다니는 독서였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유람(遊覽)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행이나 탐방이, 세상을 읽고 사람을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인문학의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남명은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지리산을 닮고자 했다. 그는 “나도 어찌하면 저 두류산처럼 될까(爭似頭流山) /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고 서 있는(天鳴猶不鳴)”이라며 지리산을 큰 북채가 아니면 소리가 나지 않은 커다란 종으로 비유하고, 자신 또한 그런 쉽게 소리나지 않는 큰 종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 큰 종은 쉽게 울리지 않겠지만, 만약 소리를 냈다면 최석기 교수의 말처럼 조선팔도에 울려 퍼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처럼 그는 하늘과 맞닿은 듯 높고 변함없는 천왕봉을 보면서 자신 또한 높고 흔들림 없는 존재가 되길 지향했을 것이다.
남명은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이전에 다녀간 선현들의 흔적을 느끼고 그들의 삶과 세상을 보았다. 신령스런 산으로 인식되던 지리산은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다. 지리산의 명승고적을 찾은 사람도 있고, 시절의 어지러움을 피해 은둔하러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 남명은 그런 지리산에서 고려 왕실의 어지러워짐을 예견하고 지리산으로 들어온 한유한(韓惟漢), 연산군의 폭정을 피해 들어왔던 정여창(鄭汝昌)과 조지서(趙之瑞)의 자취를 만났고 그들이 살았던 세상을 떠올렸다. “훗날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 길로 와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다”며 그가 살았던 당시의 세상 또한 돌아보았다.
남명과 같은 유학자들은 현실을 정치 속에서 그들의 도(道)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만큼, 자연을 은둔과 도피의 대상으로서만 여기지 않았다. 인간의 자취와 세상의 자취를 읽는 곳이자 당대의 현실을 반성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들의 자연이나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유람을 보고 있노라면 유희라고 하기에는 너무 경건하고 비장하여 일종의 ‘순례(巡禮)’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2.
자연을 유람하면서 그 속에서 인간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며 인간의 덕성을 논하고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선비들이 자연을 대하거나 역사적 유적을 탐방하면서 그 속에서 선현들의 자취를 느끼고 배우고자 노력했고, 그런 순례(巡禮)의 길을 걸었다. 그런 사례는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순례는 존경받는 선현(先賢)을 만나는 길인데, 특히 남명이나 퇴계와 같이 덕이 높은 대유(大儒)를 모신 서원을 탐방하는 길은 순례의 성격이 더 강했다. 남명이 만년을 보냈던 산천재(山川齋)를 가는 길에는 ‘입덕문(入德門)’ ‘탁영대(濯纓臺)’ 등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옛 선비들이 높은 스승을 만나기 전, 이곳에서 다시 한번 경건히 마음을 가다듬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입덕문(入德門)’은 남명과 같은 덕이 있는 인물이 살던 덕산(德山)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표시이다. 지금은 원래의 위치에 도로가 생기면서 그 옆으로 옮겨져 있는데, 그 곳을 지나면서 옛 선비들은 남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음을 가지런히 했을 것이다.
지나는 사람이 여기서 정말로 갓 끈을 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명을 찾은 많은 선비들이 입덕문과 함께 여길 지나면서 시를 남긴 것을 보면, 이곳은 선비들에게 어떤 영감과 깨달음, 그리고 자기와 세상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곳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산천재(山天齋)는 어떠한가. 남명이라는 큰 스승이 말년을 보낸 곳이자, 신성한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곳이다. 주변의 환경이나 산천재의 모습이 예전의 그대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남명이 생활한 흔적을 엿볼 수 있기에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글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있다. 남명도 봤을 뜰의 그 매화와 그 천왕봉을 보고 있노라면, 너른 마당과 작지만 꼿꼿하게 서 있는 산천재에서 선생의 기개를 느낄 수 있다.
입덕문-탁영대-산천재(그 근처에 남명 선생의 묘소가 있다)-덕천서원, 세심정으로 이어지는 길은 이 길을 걷는 선비들에게 남명과 남명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고 자신과 시대를 돌아보게 하는 순례의 길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차로 하루만에 휙휙 돌아버리기에 순례의 느낌을 받기엔 부족하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다.
흔히 순례(巡禮)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이 종교적인 순례다. 스페인의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곳이 매우 유명하다. 이는 예수의 제자 야곱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의 북서쪽의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라는 곳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에는 성당과 같은 무수한 종교적 공간이 있고 역사의 흔적과 이야기를 담은 전설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순례자들은 성스럽고 행복하게 이 길을 걷는다고 한다.
조선시대 옛 선비들의 순례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존경하는 스승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을 방문하는 길은 세속에서 깨달음과 도를 실현하려는 유학자들에겐 종교적인 순례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이런 길을 천천히 걸으며, 남명처럼 산을 보고, 물을 보며, 역사 속의 고인을 보고 그들이 살았던 세상을 볼 수는 없는 것일까?
3.
지난 2013년, 전국의 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도 이를 통해 남명을 다시 만났고, 최석기 교수의 깊은 안내도 받을 수 있었다. 전국의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이 사업은, 어렵게만 여겨지는 인문학을 ‘책-강연-탐방’으로 묶어 ‘재미있고 유익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물론 폭발적인 성원과 참여 속에서 이 사업은 진행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인문학의 대중화’, ‘재미있고 유익한 인문학’을 경험했으니,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통해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풍성하게 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런 성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탐방’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길 위’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시대부터 근현대까지에 이르는 역사, 문학 등과 관련된 주제의 장소를 탐방하는데, 탐방 전의 책읽기와 전문가로부터의 강연은 현장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사업의 탐방을 두고 ‘과연 탐방이 인문학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탐방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놀러가는 여행과 무엇이 다르냐?’는 의심이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는 공짜여행이 주는 ‘유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는 의심이 이런 비판의 배경일 것이다.
그런 의심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탐방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문제다. ‘책은 앉아서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하는 독서’라는 잘 알려진 구절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좋은 탐방은 웬만한 독서나 강의에 뒤지지 않는다. 직접 체험하여 얻은 배움만큼 오래가고 소중한 것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유희와 재미만을 쫓지는 말아야 한다.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길 위의 인문학’은 인문학적인 탐방이 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옛 선비들의 탐방을 살펴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의 걸었던 순례의 길을 우리도 이 땅에서 다시 걷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일지는 모르지만 최석기 교수는 ‘<길 위의 인문학>은 순례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남명이 걸은 길이나, 남명을 찾아가는 길은 순례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러고보면 우리 국토에는 옛 선비들이 걸었던 수많은 순례의 길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한국형 순례자의 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옛 선비들 따라 순례자 되어보는 것은 또한 어떤가!
글/ 송치욱(기획위원)
* 이 글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하는 <도서관문화> 2014년 1월호에도 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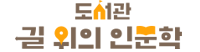







.jpg)
